전체메뉴
쌉쌀한 내장, 꼬들꼬들한 살점 살을 오므리거나 꿈틀거리는 놈, 서로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싱싱한 놈. 활력 있는 전복을 사먹는 지금이 좋은 시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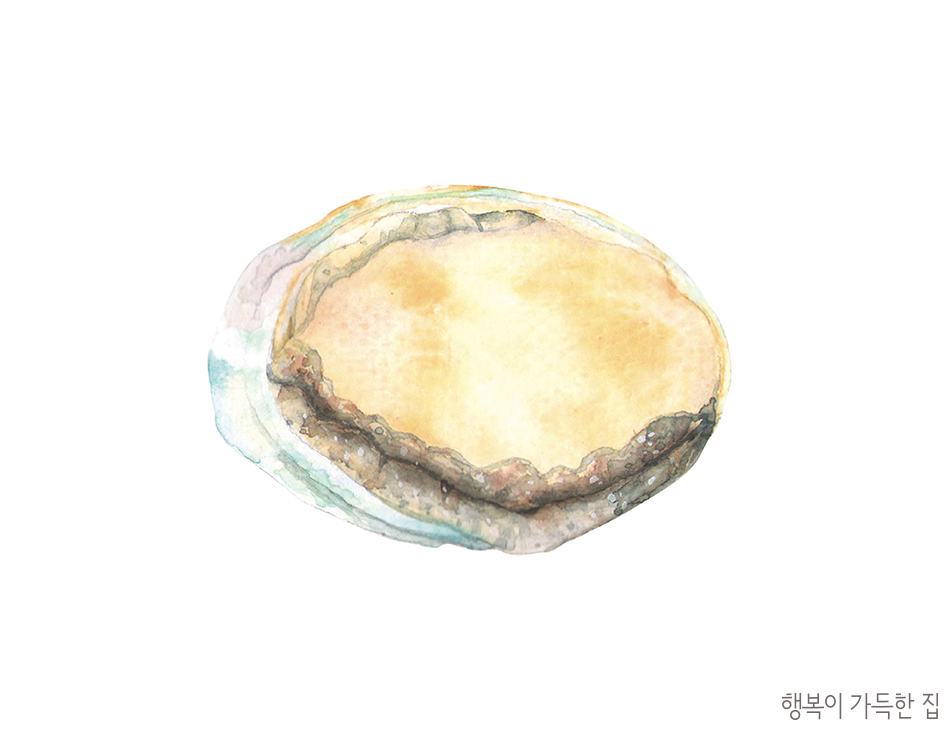
주말에는 동네 시장을 종종 가본다. 재래시장이 많이 쇠퇴했다지만 관악구의 여러 시장은 아주 잘된다. 시장이 활성화되었는지 알려면 채소와 해물의 품질을 보는 게 꽤 정확하다. 선도와 품질, 그리고 고급품도 팔리는가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딸기 철에 1kg 박스당 1만 원이 훌쩍 넘는 고급 품종인 죽향이나 육보를 파는 시장은 윤기가 돈다는 걸 알 수 있다. 해물이라면 커다란 은갈치나 문어, 몇 년 새 늘 금값인 큰 생고등어를 파는가 보는 거다. 내가 가는 ‘남성시장’은 좋은 해물 가게들의 격전지다. 너덧 개의 괜찮은 가게가 싸운다. 물론 물건으로 경쟁한다. 난전처럼 해물을 막 쌓아놓고 파는 집에 손님이 몰리게 마련인데, 요즘 잘 나오는 품목이 전복이다. 아기 손바닥만 한 걸 스무 마리쯤 담으면서 2만 원을 부른다. 싸다. 전복이 대중 시장의 난전에 나오는 시대다. 횡재다! 전복은 크기별(정확히는 무게별)로 구분해서 판다. 킬로그램당 4~5미(마리)짜리는 최고급 횟감으로 쓰이고 요릿집이나 호텔에 들어간다. 보통 10미, 12미, 14미, 20미 같은 중치를 많이 쓴다. 찌개나 라면용(?)인 40미짜리도 나온다. 전복이 비쌀 때는 강남의 몇몇 와인 바에서 전복 두어 마리 넣은 라면을 ‘황제라면’이라고 해서 팔기도 했다. 전복은 정말 황제나 먹는 엄청난 해물이 맞다. 옛날 벼슬아치들은 제주에 부임하면 전복을 서울에 보내는 일로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그때는 전복 양식을 하지 않을 때였으니, 어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남자들이 전복 가렴주구를 못 견디고 도망가는 바람에 잠녀, 즉 해녀가 탄생 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당대에도 전복 하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많다. 양식업자다. 전복 양식 기술은 한국이 최고다. 한데 요즘은 코로나19 문제로 수출이 잘 안 된다. 일본과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가는데 그 나라들도 경기가 엉망이기에 수입량을 줄였다. 생산 과잉이 제일 큰 문제다. 먹어서 해결해주자. 어쨌든 사 먹는 우리는 좋은 시절이다. 그렇다는 얘기다. 전복은 보통 완도산으로 알고 있지만 제주산도 있고 남해안의 여러 곳에서 기른다. 흑산도, 진도 등도 주력 산지다. 바다에 가두리양식장을 설치해 기르는 게 대부분이고, 육상에 수조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퍼 올려서 기르기도 한다. 전복이 싼 이유는 이처럼 생산지와 생산량이 늘어서다. 10년 전에 비해 너덧 배 늘었다. 소비량은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러니 싸다.
전복은 아주 영리한 동물이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내 친구 말에 따르면, 큰 놈들 몇 마리를 따로 수조에 둔 적이 있는데, 밥 주는 사람의 발소리를 알아듣는다 했다. 전복이 크면 나이가 서너 살도 넘는다.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빠르다. 우리가 보는, 유리 수조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모습과는 영 딴판이다. 전복은 손이 많이 가는 생물이기는 하지만, 양식한 전복이라도 어느 정도는 자연산 느낌을 지니고 있다. 특히 먹이 활동이 그렇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먹는다. 그걸 사철 공급한다. 더울 때는 염장한 것을, 추운 제철에는 싱싱한 걸 먹이로 준다. 먹성도 엄청 좋다.
좋은 전복을 고르자면, 선도다. 생산지는 별 차이가 없다고들 한다. 물론 양식에 한해서다. 간혹 시장이나 마트에서 죽은 전복을 ‘찌개용, 구이용’이라하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나 같으면 안 산다. 산 것도 싼데 굳이…. 전복은 모양을 딱 보면 활력을 알 수 있다. 살이 넓게 퍼진 놈은 살아 있더라도 힘이 없다. 살을 오므리거나 꿈틀거리는 놈, 서로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놈이 더 싱싱하다. 원래 손으로 만지면 에티켓이 아니지만, 살을 눌러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건 피한다.
작은 놈은 껍데기째 찌개나 라면에 넣어 익히면 잘 분리된다. 큰 놈은 손질해서 넣는데, 전복은 삶아도 국물 맛이 깊은 조개는 아니다. 그래서 보통 찐 후 살과 내장을 분리해 용도에 맞게 쓰는 경우가 많다. 전복은 산 채로 찌면 내장과 살이 잘 분리된다. 부들부들한 식감이 나도록 살을 넓게 포를 떠서 다시 팬에 굽거나(버터구이), 간장볶음을 해도 좋다. 이때 익은 내장도 넣으면 맛있다. 쪄서 포를 뜬 살점과 내장으로 샐러드를 만들어도 맛있다. 샐러드 채소와 함께 드레싱으로 무친다. 내장은 쌉쌀하고 살점은 깊은 여운이 있다.
전복을 회로 먹을 때는 꼬들꼬들한 맛이 살아있게 썬다. 싱싱한 놈일수록, 칼질을 빨리 끝낼수록 그 효과가 좋다. 전복은 씹을 때 미끌거리기 때문에 일부러 칼집을 내기도 하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 대신 몇 가지 팁이 있다. 우선 얇게 썬다. 날이 잘 선 칼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고는 얼음물에 잘 헹군다. 이때 식초를 몇 방울 넣는 요리사들이 있다. 전복 특유의 갯내를 없애기 위함이다. 자, 오도독오도독!(초장을 찍어 소주에 곁들여…).

‘글 쓰는 요리사’로 잘 알려진 박찬일 씨는 ‘로칸다몽로’와 ‘광화문 국밥’의 주방장이자 해박한 지식과 단정한 문장으로 음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는 음식 칼럼니스트입니다. 그 치열한 기록이 <노포의 장사법> <백년식당> <오사카는 기꺼이 서서 마신다> 등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엔 계절 식재료 이야기를 다룬 <오늘의 메뉴는 제철 음식입니다>를 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