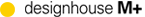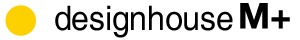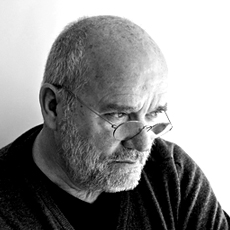〈함양당 행다법: 명상을 돕는 차 마시기〉
차에는 이를 아름답게 마실 수 있는 다법이 존재하고, 이를 행하는 것은 수련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차를 마실 수 있기에 장소의 경계는 중요하지 않지요. 이번 달 〈행복〉은 차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곳, 광주 이석리에 위치한 함양당에서 한국 전통차 문화의 깊이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백 년 된 우물가와 햇볕을 품은 마당이 아름다운 함양당에서 선차를 통해 명상의 깊이를 경험해보세요. 차 수업 이후에는 식사에 차행법을 곁들인 약식 발우공양 ‘단발우’를 체험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강사소개
⦁ 류효향
류효향 선생님은 마흔이 넘어 차인茶人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통해 얻은 위안을 함께 나누고 싶어, 차를 공부한지 10년이 되던 해에 부산 달맞이고개의 ‘비비비당’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광주 이석리에 위치한 함양당에서 한국 전통차 체험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계희
이계희 선생님은 2001년 차를 시작했습니다. 선차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8년 숙우회 정엽당의 정엽다회 수업을 시작으로 통도사 성보박물관 사범반 선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숙우회 정엽당의 사범으로 정엽다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말사 다도회에서 선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개요
⦁ 일자 4월 11일, 5월 9일, 6월 13일 금요일
⦁ 시간 오전 10시~정오
⦁ 인원 10명
⦁ 장소 경기 광주 함양당 한옥(상세 주소 개별 공지)
⦁ 비용 30만 원(총 3강, 재료비 포함)
⦁ 문의 02-2262-7349
커리큘럼
| 1강 | 선차 |
|
행다 청풍잎차
발우공양 단발우(밥, 국, 나물, 전 황차)
|
|
2강 | 선차
|
|
행다 청풍말차
발우공양 단발우(밥, 국, 나물, 전 황차)
|
3강| 선차,
접빈 다례 |
|
행다 양류홍차(선차), 수류잎차(접빈 다례)
발우공양 단발우(밥, 국, 나물, 전 구증구포 구기자차)
|
관련기사
〈행복이 가득한 집〉 2023년 8월호
― 아름다운 한옥 류효향 선생님의 함양당
함양당에는 문화가 흐른다. 연극·영화계의 원로인 김정옥 선생이 처음 광주 이석리에 터를 잡았고, 이어 김병종 화백이 왕십리의 1백여 년 된 한옥을 해체해 이 터에 집을 짓고 ‘함양당含陽堂’이라 이름 붙였다. 이제는 류효향 선생이 아름다운 차 향기 가득한 문화 공간으로 꾸려나가려고 한다. 기사 보러가기

:: 청풍
청풍은 선차의 첫 출발점이다. 선차는 차와 선이 한 맛이다라는 의미도 내포하지만, 숙우회에서의 선차는 명상 중에 다법을 행하며 차를 마시는 행위를 지칭한다. 차는 명상과 등등한 관계가 아니다. 차는 명상의 효과를 돕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청풍의 모태는 한국 선종 사찰의 발우공양이다. 식사가 끝날 즈음 탕관으로 슝늉을 돌리는 부분이 다법으로 변용되었다. 청풍 행다법은 선종 불교의 심플리시티를 제일의 덕목으로 내세운다.
:: 양류
‘수양버들’을 의미하는 양류는 물가에서 자라는 수양버들은 청량함을 상징한다.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원한 이슬 방울이 달려있는 버들이다. 양류의 다법에서는 버들 가지를 가지고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다법이다.
:: 수류
‘물결 따라 흐름’을 의미한다. 마음이 만경지를 따라 움직이나 움직이는 곳마다 모두가 그윽하니 그윽한 흐름 따라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근심도 모두 없으리라는 전법게송의 의미를 다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 단발우
식사에 차행법을 곁들인 세속인을 위한 약식(略式) 발우공양이다. 소심경의 게송을 생략하고 발우보와 수저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발단(鉢單, 발우 깔개)에 발우를 펴고, 슬건(膝巾, 냅킨)을 접어 수저를 끼운다. 발단(鉢單)에서 단발우(單鉢盂)라는 명칭을 취하였다. 식사 후 네 개의 발우를 닦아 포갠 다음 제3발우와 제4발우를 다시 펴서 각각 찻잔과 다식 그릇으로 사용한다.
|